[403호 20세기, 한국,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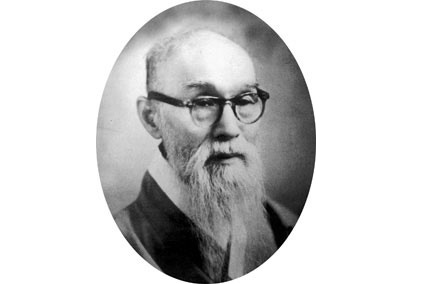
성결교회는 해방 이전 한국에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세를 자랑한 개신교 교단이었다. 세 교단은 흔히 머리글자를 따서 ‘장감성’으로 지칭되었다. 195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한 순복음교회 등으로 인해, 현재는 이전과 같이 3대 교단 안에 드는 위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는 2년 전 설문 조사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 500명과 장로 500명 중 절반 이상인 51.9%가 성결교단이 더 이상 한국 개신교회의 3대 교단이 아니라고 응답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1) 그러나 해방 전 성결교의 위상은 높았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중산층 주류 모교단이 파견한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1880년대부터 전도(교회)와 교육(학교), 의료(병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며 성장했다. 이와는 달리, 일본에서 활동하던 작은 미국 선교단체인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의 성서학원을 졸업한 두 한국인 전도자 정빈(鄭彬, 1878-?)과 김상준(金相濬, 1881-1933)이 1907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태동한 성결교회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비해 재정과 인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직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장로회 4개 선교회(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와 감리회 2개 선교회(미국 북감리회, 미국 남감리회)가 1880년대 말부터, 한국인이 거주하던 한반도와 제주도, 만주, 시베리아를 대상으로 선교지 분할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별로 선교지를 독점했다. 이 분할 정책에는 오직 장로회와 감리회 선교회들만이 동참했으므로, 이른 시기에 입국한 영국계 교파인 성공회와 구세군은 말할 것도 없고, 선교가 늦었던 성결교회도 이 협약에서 소외되었다. 따라서 이미 장로회와 감리회가 선점한 선교 구역에서 활동한 성결교 사역자들은 지역의 장로교 및 감리교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인 장로회 및 감리회 신자들에게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성결교회는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신안의 도서 지역에서 상당한 전도 성과를 보이며 성장했다. 현재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라는 이름의 성결교회 협력 기구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 세 성결교회가 소속되어 협력하고 있다.

